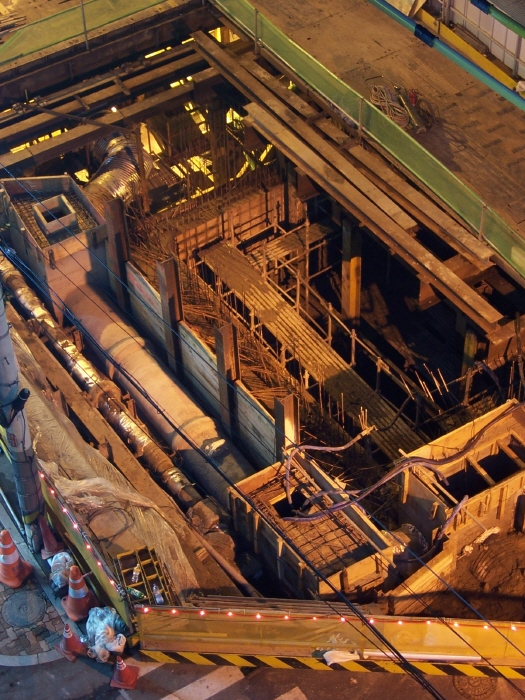어디에선가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 어떤 별자리로 향한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소, 그런데 그 별자리는 또 우주의 어느 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요, 나도 더 알고 싶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요, 여기를 보시오, 우리는 반도에 있소, 반도는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소, 바다는 자신이 속한 지구와 함께 돌고 있소, 지구는 자전을 하지만 태양 주위를 돌기도 하오, 태양 역시 자전을 하고 있소, 그러니까 이 모두가 앞서 말한 별자리를 향해 하고 있는 거요, 따라서 나는 혹시나 우리가 이 운동 내의 운동으로 연결되는 사슬에서 마지막 고리가 아닌지 자문해 보고 있는 거요, 사실 내가 궁금한 건 우리 안에서는 무엇이 움직이느냐, 그것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요, 아니, 아니, 나는 벌레나 세균이나 박테리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오,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소, 별자리, 은하계, 태양계, 태양, 지구, 바다, 반도와 되셰보가 움직이면서 자기들과 더불어 우리를 움직이듯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움직이는 어떤 것 말이오, 그러니까 나머지 전체를 움직이는 것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는 거요, 사슬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어쩌면 사슬은 없고 우주는 하나의 고리인지도 모르겠소, 아주 가늘어서 우리와 우리 안에 있는 것만 들어갈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주 굵어서 최대 크기의 우주, 즉 고리 자체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말이오,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의 이름은 뭘까. 보이지 않는 존재는 인간과 함께 시작됩니다.
사라마구 '돌뗏목' 중에서
아주 긴 질문, 간단하고 놀라운 대답 주제 사라마구가 좋다.
사라마구 작품은 대체로 좋지만 '돌뗏목' '리스본 쟁탈전' '모든 이름들'이 특히 좋다.
'눈먼자들의 도시'는 읽을땐 충격이었는데, 인상적인 구절이 없어서~